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수액 주사 한 번 맞거나 도뇨관을 교체하기 위해 매번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현실은 많은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도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의 기능을 생활 돌봄에 국한하지 말고, 간단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수액 주사나 도뇨관 교체, 혈액검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이용은 2023년 기준 72만 7천 건에 달했고, 전체 가정간호의 62.3%를 차지하며 시설 내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중 절반은 수액 등 주사행위였으며, 도뇨관이나 비위관 관리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현장의 환영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요양시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현재 전국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율은 24.7%에 불과하다. 즉, 4곳 중 3곳은 간호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근무 중인 간호사도 외래 동행, 기록 정리, 위생관리 등 다양한 비의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면, 현실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 강화’를 꼽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숙련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행위 확대는커녕, 기존의 운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의료를 넣자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간호사를 못 구해 시설 폐쇄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법만 바뀌면 오히려 기준을 못 맞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도의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력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는 책상 위 논의에 그치고, 현장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의료행위 확대가 ‘의료기관 기능을 요양시설이 대체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책임 소재, 보험 청구 체계, 응급 대응 역량 등 다층적인 문제가 얽힐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 없이도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감염이나 응급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불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의료행위 확대는 단순히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행위를 도입하기 전, 간호인력 수급 대책과 교육체계, 책임 주체,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보다 우선할 것은 ‘현실 검토’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는 현실 위에 설 때 비로소 작동한다. 간호사가 없거나, 있어도 과로 상태인 시설에서 의료행위까지 확대되면, 이는 보호자의 편의보다는 시설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그 기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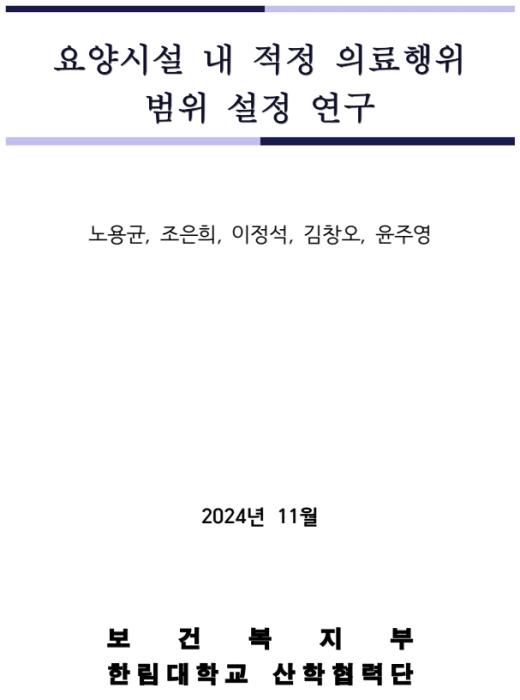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수액 주사 한 번 맞거나 도뇨관을 교체하기 위해 매번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현실은 많은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도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의 기능을 생활 돌봄에 국한하지 말고, 간단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수액 주사나 도뇨관 교체, 혈액검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이용은 2023년 기준 72만 7천 건에 달했고, 전체 가정간호의 62.3%를 차지하며 시설 내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중 절반은 수액 등 주사행위였으며, 도뇨관이나 비위관 관리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현장의 환영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요양시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현재 전국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율은 24.7%에 불과하다. 즉, 4곳 중 3곳은 간호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근무 중인 간호사도 외래 동행, 기록 정리, 위생관리 등 다양한 비의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면, 현실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보고서는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 강화’를 꼽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숙련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행위 확대는커녕, 기존의 운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의료를 넣자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간호사를 못 구해 시설 폐쇄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법만 바뀌면 오히려 기준을 못 맞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도의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력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는 책상 위 논의에 그치고, 현장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또한 의료행위 확대가 ‘의료기관 기능을 요양시설이 대체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책임 소재, 보험 청구 체계, 응급 대응 역량 등 다층적인 문제가 얽힐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 없이도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감염이나 응급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불안이 존재한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의료행위 확대는 단순히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행위를 도입하기 전, 간호인력 수급 대책과 교육체계, 책임 주체,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보다 우선할 것은 ‘현실 검토’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는 현실 위에 설 때 비로소 작동한다. 간호사가 없거나, 있어도 과로 상태인 시설에서 의료행위까지 확대되면, 이는 보호자의 편의보다는 시설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그 기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수액 주사 한 번 맞거나 도뇨관을 교체하기 위해 매번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현실은 많은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최근 요양시설 내에서도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의 기능을 생활 돌봄에 국한하지 말고, 간단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수액 주사나 도뇨관 교체, 혈액검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이용은 2023년 기준 72만 7천 건에 달했고, 전체 가정간호의 62.3%를 차지하며 시설 내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중 절반은 수액 등 주사행위였으며, 도뇨관이나 비위관 관리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현장의 환영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요양시설의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 현재 전국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율은 24.7%에 불과하다. 즉, 4곳 중 3곳은 간호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근무 중인 간호사도 외래 동행, 기록 정리, 위생관리 등 다양한 비의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의료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면, 현실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보고서는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 강화’를 꼽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숙련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행위 확대는커녕, 기존의 운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에 의료를 넣자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간호사를 못 구해 시설 폐쇄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법만 바뀌면 오히려 기준을 못 맞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도의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력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는 책상 위 논의에 그치고, 현장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또한 의료행위 확대가 ‘의료기관 기능을 요양시설이 대체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책임 소재, 보험 청구 체계, 응급 대응 역량 등 다층적인 문제가 얽힐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 없이도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감염이나 응급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불안이 존재한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의료행위 확대는 단순히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행위를 도입하기 전, 간호인력 수급 대책과 교육체계, 책임 주체,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보다 우선할 것은 ‘현실 검토’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는 현실 위에 설 때 비로소 작동한다. 간호사가 없거나, 있어도 과로 상태인 시설에서 의료행위까지 확대되면, 이는 보호자의 편의보다는 시설의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그 기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