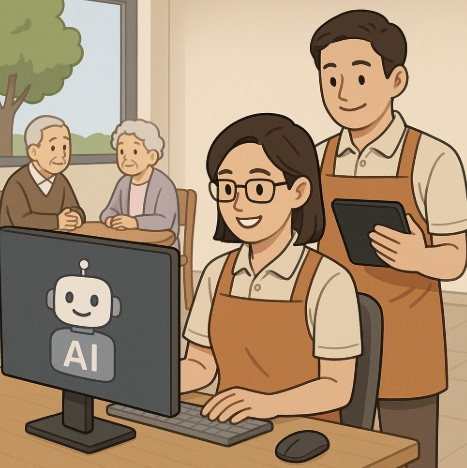글. 예천주야간보호센터 김성민
필자는 경상북도 예천에서 ‘예천주간보호센터’라는 조그마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AI 산업 이야기가 쏟아진다.
김호중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께서 “이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GPT와 같은 AI툴, 그리고 IoT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다. 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항상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보내는 시간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비중이 너무 크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IoT 기술과 같은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효율을 높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의 벽이 컸다. 그때 눈을 돌린 것은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AI툴이었다.
적은 비용으로도 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머리 속으로 생각만 했었던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조금씩 실현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AI, 단순한 검색툴이 아닌 ‘분석 파트너’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GPT, 제미나이와 같은 AI툴을 단순히 ‘검색’이나 ‘문서작성 도우미’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이다. 나는 바로 그 점을 우리 센터에 적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했고,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사의 핵심업무인 어르신 기초평가와 급여제공계획이다. 장기요양 실무자라면 잘 알다시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자료 간의 연결성과 일관성’이다. 욕구사정에서 시작해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행정적이고, 반복적인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업무에 사회복지사의 귀중한 시간을 모두 쏟는 것보다, AI툴의 분석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AI를 통해 욕구사정 결과를 분석하여 급여제공계획 작성에 있어 도움을 받으며, 요양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 기록을 분석하여 작성된 계획이 실제로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AI 분석은 자료 간의 논리적 연결성과 풍부한 서술 내용을 동시에 충족시켜주었으며, 평가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에 쏟던 복지사들의 귀중한 시간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AI의 분석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행정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관장이나 실무자들은 AI툴을 업무에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AI 활용 시 주의할 점 두 가지
첫째, 실무자는 해당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업무의 본질을 모르고 단순히 AI가 작성한 결과를 복사·붙여넣기만 한다면, AI를 활용하는 의미가 없다.
AI의 단점 중 하나는 가끔 ‘부정확함’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AI는 복지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도구여야 한다.
둘째,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업무량 감소’가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AI 덕분에 업무가 간소화되었다면, 그만큼 어르신과의 교류, 관찰, 개별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AI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